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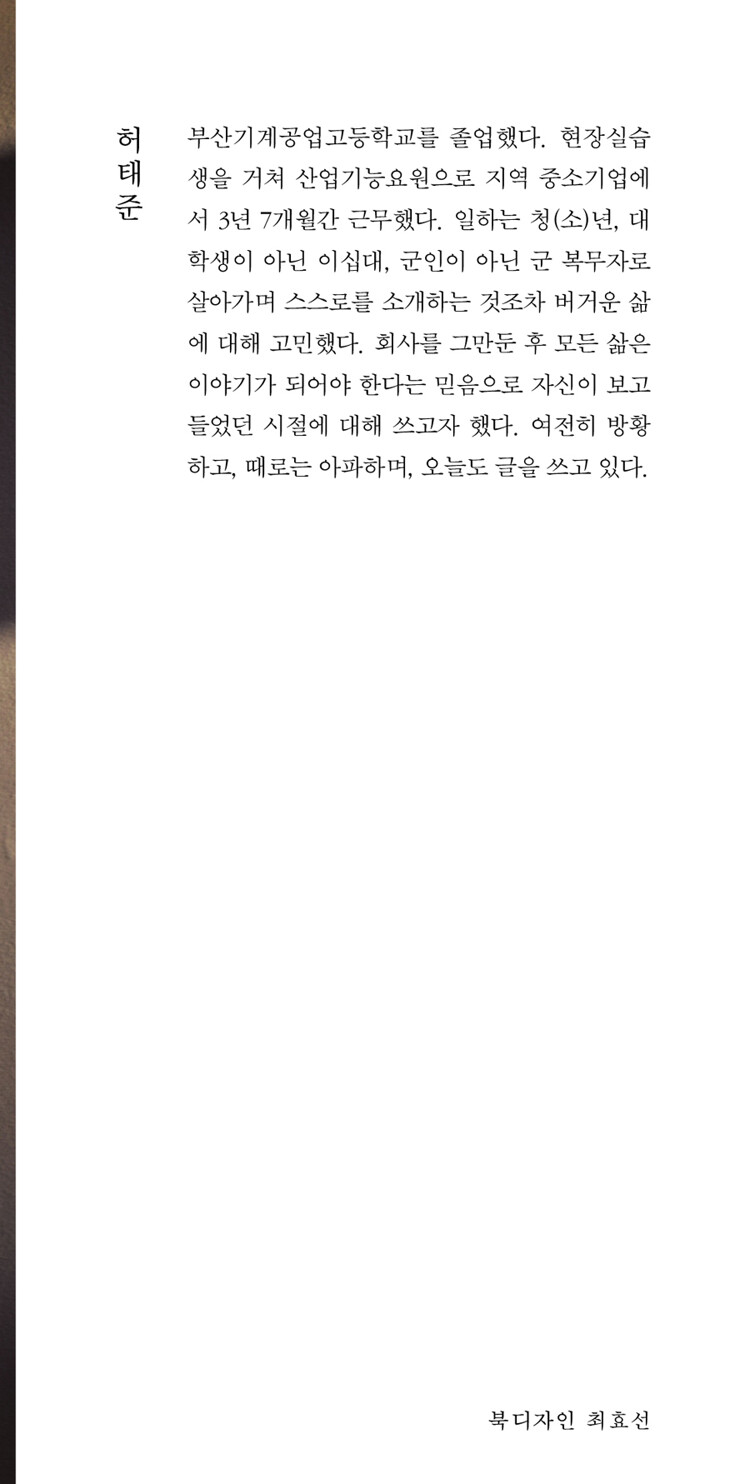







올해는 스물두 살의 나이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되는 해이다. 우리의 현실은 그때보다 얼마나 나아졌을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고작 열여덟, 열아홉 살 나이의 청년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몰고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도 나 몰라라 하는 기성세대들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 바 없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현장실습생/청년노동자에 관한 이야기가 재조명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사고가 다를 바 없이 반복된다. 어떤 삶은, 죽음을 통해서라야 겨우 제 존재를 드러내지만 그마저도 곧 신문과 뉴스에 파편화되어 흩어지는 정보로 남을 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 현장실습생/청년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노동 담론 안에서도 더 잘게 계급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노동 문제 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서 삶을 버텨야 하는 이들은 어쩌면 10대의 고졸 노동자들일지 모른다. 전태일 열사는,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다면 좋았겠다고 처연하게 독백했지만 지금은 대학 진학이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흔한 시대다. 그럼에도 집안 형편을 비롯해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진학을 거쳐 곧바로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개개인의 사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 취업률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국가 정책과 그 속에서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아이들. 이들이 맞닥뜨리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첫 사회생활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린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꿈과 적성을 고민할 틈도 없이 공장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맞이해야 하는 반복되는 일상. 늘 누군가가 죽을 때라야 주목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 보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과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우연히(?)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커다란 아픔이 있음을, 더 나아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사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나 만화에서도 이십 대는 다 대학생이었고, 직장인은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전으로나 전해지는 동화 같았다. 누군가의 경험담으로 가늠해보는 게 최선이었고, 그마저도 모호하고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다.” - 본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