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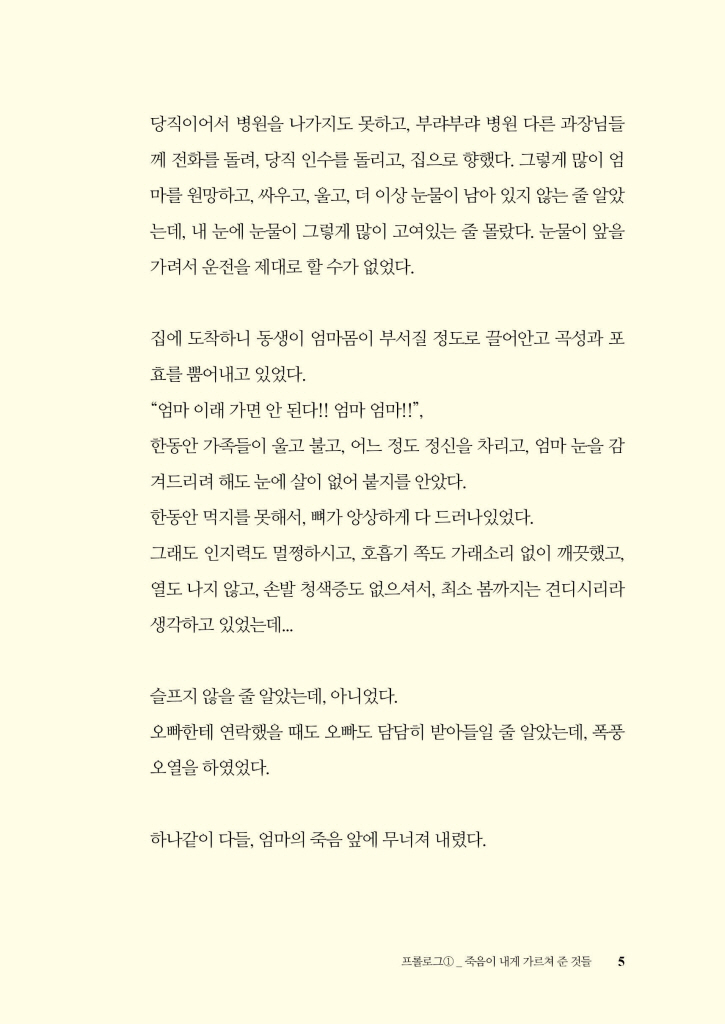






죽음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새벽 조카 수인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고모! 할머니가 이상해요. 귀에 이어폰 꽂고 있어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말이 횡설수설 이어졌다 끊겼다 했다.
‘할머니 돌아가신 거 같아요’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를 못했다.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닌데,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조금 있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죽었다. 엄마 죽었다.!!! 엄마!!! 엄마!! 빨리 집에 온나!! 엄마 죽은 거 같다!!’
통곡과 함께 울부짖는 짐승과 같은 소리를 내퍼붓는 동생의 목소리다.
당직이어서 병원을 나가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병원 다른 과장님들께 전화를 돌려, 당직 인수를 돌리고,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많이 엄마를 원망하고, 싸우고, 울고, 더 이상 눈물이 남아 있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고여있는 줄 몰랐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동생이 엄마몸이 부서질 정도로 끌어안고 곡성과 포효를 뿜어내고 있었다.
“엄마 이래 가면 안 된다!! 엄마 엄마!!”,
한동안 가족들이 울고 불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엄마 눈을 감겨드리려 해도 눈에 살이 없어 붙지를 안았다.
한동안 먹지를 못해서, 뼈가 앙상하게 다 드러나있었다.
그래도 인지력도 멀쩡하시고, 호흡기 쪽도 가래소리 없이 깨끗했고, 열도 나지 않고, 손발 청색증도 없으셔서, 최소 봄까지는 견디시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슬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오빠한테 연락했을 때도 오빠도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폭풍 오열을 하였었다.
하나같이 다들, 엄마의 죽음 앞에 무너져 내렸다.
39세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게 내 나이 열 살 때였다.
나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다. 추웠고, 길에는 사람들도 없는 황량한 시골길, 상복 입은 우리 남매들, 아버지의 한지로 만든 꽃송이라 뒤덮인 아버지의 상여, 우리 남매들에게 죽음은 너무 일찍 찾아왔다.
우리가 작은 사고라도 칠라치면, 아버지 없이 자란 놈들, 호로자식들 소리 들을까 봐 엄마는 노심초사하셨고, 우리를 더 엄하게 다루셨다.
그런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워하고, 보면 제일 반갑고,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 엄마.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는 그러한 존재이리라.
근 8년간의 엄마의 투병생활을 함께하면서, 엄마를 엄마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엄마를 알게 되었고, 삶에 대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엄마의 마지막이 현실로 다가옴을 알게 되고, 엄마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죽음을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죽음이란 것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고, 죽음이 다가오면 더 무섭고,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죽음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나에게 죽음은 단지 일상 중 하나일 뿐이다.
보호자들에게는 그 죽음은 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다.
심전도 기계 플랫 음이 뜨면 결재하듯이 진단서 싸인 후, 오열하는 가족들에게 가벼운 목례로 끝내는 일과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죽음이 나에게도 다가왔다. 그동안 수많은 가벼운 일상의 죽음은, 엄마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에게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듯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병원 종사자들, 특히 호스피스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이 죽음들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죽음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려 주고 싶었다.
내 주변의 죽음이 아니라 낯선 타인의 죽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은 요양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이고, 병원 당직생활과,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수백 명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던 거 같다.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의학적 죽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 글을 쓰기 몇 시간 전에도 나는 한 사람의 심장 박동이 서서히 멈춰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익숙할 수도 있는 죽음이 더 낯설게 ,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나는 죽음의 전문가도 아니고, 죽음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에서 마주하는 늙어감, 아픔과 죽음의 얼굴을 들여다보려 한다.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죽음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잘 늙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잘 늙기 위해서, 잘 사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의 글들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늙어가는 누군가에게, 길잡이 이정표라도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글들이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아픈 이들을 돌보는 슬프고 힘든 이가 있으면, 이 책과 같이 하면서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