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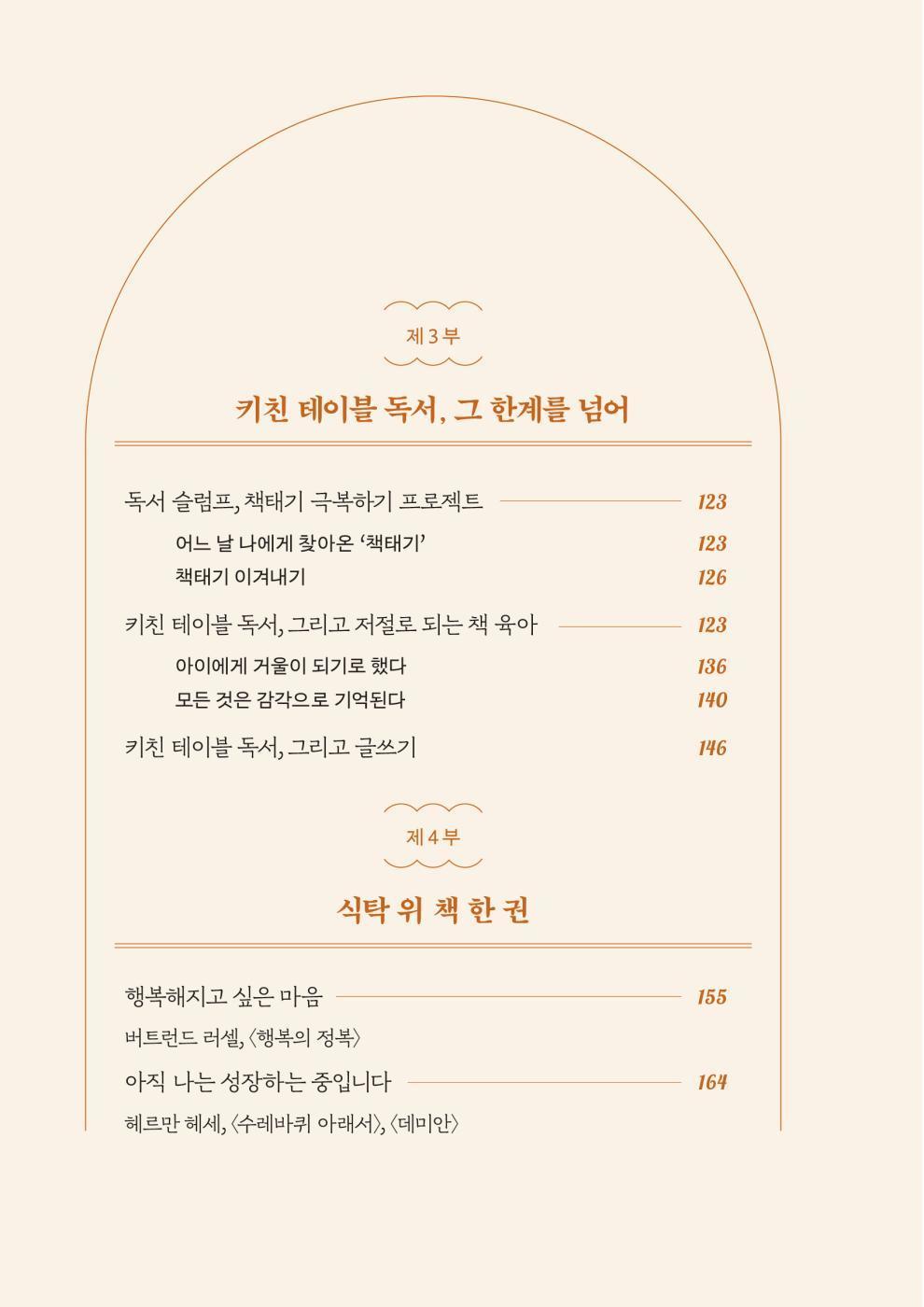




첫 아이를 낳고 맞이한 내 인생의 대혼란기. 육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혼란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다. 일단 아이를 낳기만 하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막상 실전에 돌입해 보니 아이를 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단한 나날들이었다. 누군가 그때의 나에게 “방긋방긋 웃는 예쁜 아이를 보면 그런 어려움은 상쇄되지 않나요?”라고 묻는다면 그것과는 별개라고 답하고 싶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온 누군가를 위해 온종일 나를 내려놓는 하루의 풍경은 행복함, 안온함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이다. 오롯이 내 도움만을 바라며 자고 울고 먹고 또 우는 작은 생명체를 건사하는 생활은 그야말로 나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날것’의 생활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첫 아이는 알레르기 체질로 피부가 늘 울긋불긋하고 거칠었고, 제한해야 하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눈물로 보낸 시간이 참 많았다. 그때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힘들다. 이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창 육아를 하던 때 하루 중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은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 먹이고 치우고 재우고 달래는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물건과 놀이 흔적으로 어질러진 집을 대충이라도 정돈하고 나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 선물같이 찾아온다. 그 시간 동안 고요한 집 안에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바로 책이었다. 육아를 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나와 아이를 가운데에 둔 작은 동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닿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갈망은 점점 커져갔다. 이런 나에게 책은 다른 세계와의 만날 수 있는 통로였고 출구였다. 나와는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건네는 말과 위로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때 내가 찾은 답은 역시 ‘책’이었다. 아이들이 달콤한 낮잠에 빠지면,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책을 집어 들었다. 쌓여 있는 집안일을 잠시 멈추고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인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나와 만났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어두운 밤에도 책을 읽기 시작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식탁 앞에 앉으면 소란스러웠던 세상이 멈추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기분 좋은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책을 읽었다.